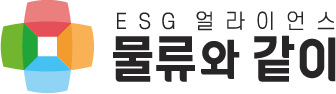글. 이성일 마켓컬리 로지스틱스 리더 / 정리. 임예리 기자
“물류는 상품 그 자체다”
필자가 수도권 새벽배송 업체 데일리쿨을 운영하고 있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중요한 일로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흔쾌히 미팅 일정을 잡았다.
2015년 2월 28일 약속 당일, 봄기운은 아직 함흥차사였고, 매서운 추위만이 몰아치던 날이었다. 신사동 한 커피숍 구석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명의 젊은 남녀가 앉아 있었다. 막 산에서 내려온 듯한 커다란 가방에 청바지와 점퍼를 무심하게 입고 나온 그들 앞에서, 칼주름이 잡힌 정장 차림을 차려입은 게 오히려 결례인 듯 머쓱해졌다.
“저희는 온라인을 통해 좋은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류’가 필요해서요” 반짝이는 눈을 한 그들이 말했다. 그들이 필자에게 건넨 건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사업자 등록증 한 장이 전부였다. 비즈니스 시작은커녕 변변한 사무실도 없었고, 팀 구성도 필자 눈앞에 있는 그 둘이 다였다.
“음식에 대한 사람의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에너지를 충전하는 목적으로 음식을 대하는 태도’와 ‘건강, 맛, 분위기 등 에너지 충전 이상의 목적으로 음식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후자의 태도를 가진 이들을 주고객으로 삼고, 나아가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즐거운 것이 있다’라고 알리고 싶어요. 즉 우리의 목표는 음식의 ‘문화적 확산’입니다. 특히 한국 식품유통은 아직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낮은 품질의 식재료를 높은 가격을 주고 사먹게 돼있어요.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낮고, 결과적으로 먹는 즐거움을 놓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설명이 진행되는 동안 ‘문화적 확산’이라는 말이 귓가를 계속 맴돌았다. 당시 데일리쿨은 새벽배송을 함에 있어 큰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다. 바로 시장의 규모가 작은 것이었다. 이는 물동량이 생명인 물류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였다. 규모가 어찌나 작은지, 새벽배송을 하는 모든 온라인 식품 쇼핑몰의 배송 물량을 하나의 물류업체가 통합해서 처리해야만 영업이익이 발생할 정도였다. 문화적 확산을 통한 시장 확대와, 배송대행(물류)에서 종합 식품 커머스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것으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젊은 두 남녀의 말을 무턱대고 믿을 수도 없었다. ‘과연 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지는 못하던 것이었다. 필자의 머릿속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복잡해졌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생각과는 별개로 결정은 단 15분만에 끝났다. 이들의 반짝이는 눈빛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이들이 온라인 식품 커머스의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데일리쿨의 자금과 성장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까? 사실 그것보다는, 물류 바닥에서 물류를 단순히 상품의 이동으로 취급하지 않고, ‘상품 그 자체’로 인식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후 과정은 전부 그들에게 백지위임했다. 협의 자체가 무의미했다. 모험의 시작이었다. 그때 그 두 사람의 정체는 현재 마켓컬리의 CEO와 CSO를 각각 맞고 있는 김슬아와 박길남. 그들의 첫인상은 이토록 이상했다. 그리고 2015년 3월 12일, 꽃샘추위가 잦아들 쯤, (주)더파머스(마켓컬리의 법인명)는 수도권 새벽물류를 시작했다.
샛별배송, 파격의 시작
그 이전까지 데일리쿨의 배송방식은 엄밀히 말하면 새벽배송이 아니었다. 저녁 8시에 배송을 시작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배송을 완료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은 10시간이라는 넉넉한 배송가능시간 덕분에 특정 지역에 돌발적으로 수량이 급증하는 일에 대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장시간 상품이 배송상태에 머물게 되므로 상품의 품질이 완벽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주문마감(Cut-off)을 오후 6시 정도에 맞추어야 하는 것 역시 고객 편의 측면에서 큰 방해가 되었다.
이에 우리는 과감하게 배송시간을 새벽 1시부터 새벽 6시까지, 5시간으로 반토막냈다. 이유는 간단했다. 고객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새벽 6시부터 새벽 7시까지의 보너스 완충 배송시간이,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완수해야 하는 필자에게 작은 위로가 됐다. 파격적 행보의 시작이었다.
미션은 10시간 동안 배송해야 할 양을 5시간 만에 성공시키는 것. 물리적 한계는 증차로 극복해야 했고, 이에 따른 비용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이 고민의 결과로 마켓컬리는 훗날 라우팅(Routing: 지정 권역 내에서 가장 빠른 배송 루트의 순차적 설정)이 포함된 TMS(운송 관리 시스템)를 자체 구축하였고,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파격을 위해서는, 발주부터 입고, 주문처리, 분류, 배차, 출고, 배송에 이르는 공급망 관리(SCM) 전반의 혁신이 필요했다. 이때부터 물류팀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 싸움을 했다.
이렇게 배송 밴드(Band: 순수 배송 시간)를 재구성하는 동안, ‘컬리(Kurly)’라는 근사한 브랜드 네이밍이 끝났고, 물류팀에게도 뿌듯한 훈장이 주어졌다. 바로 ‘샛별배송’ 브랜드의 탄생이었다. 기존 새벽배송을 넘어, 새벽하늘에 금성이 떠있는 시간에 배송을 하는, 국내 누구도 시도 못한 물류망을 구축한 것이었다.
만족을 모르는 팀, 장안농장의 추억
2015년 5월 21일, 마켓컬리(Market Kurly)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두 달 동안 필요한 모든 걸 끝내야 했다. 쇼핑몰 페이지 구성부터 초기 상품 구성, 전략 MD 콘텐츠(Front)와 현장운영(Back)의 연결, CS 정책수립, 물류 구축 등 물류팀뿐만 아니라 마켓컬리 구성원 전체가 전쟁 같은 두 달을 보냈다. 예정대로 서비스 론칭일이 다가왔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판매를 시작했다. 첫날 주문 건수는 ‘9건’이었다. 아무런 홍보를 하지 않았고, 큰 기대도 없었지만 9건은 적어도 너무 적은 수치였다.(필자는 지금도 9라는 숫자를 싫어한다.) 이후 시간이 꽤 흘렀다. 2016년 연말에 체크한 주문 건수는 3,800건이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였다.
2015년부터 7월까지, 충주에 있는 장안농장 센터에서 재고를 입고받고, 이를 합포장한 적 있다. 서울 수도권으로 합포가 완료된 상품을 입고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이 과정에서만 2시간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가장 합리적인 주문마감 시간이 밤 9시였다. 센터가 충주에 있는 상황에서 주문마감-배송완료 시간이 10시간이 채 안되었으니, 따지고 보면 이 역시 굉장한 일이었다. 그러나 팀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서울, 수도권에 센터가 필요했다.(사족. 이때 마트에서 수박을 잘 배송해 주지 않는 이유를 깨달았다. 수박은 무겁다. 생각보다 훨씬 더.)
악조건이 우릴 성장 시킨다
시간이 지나 드디어 하남에 300평 남짓의 조그만 창고를 임대했다. 그리고 주문마감 시간을 밤 11시로 미뤘다. 이때 느낀 것 중 하나는 서울 및 수도권에 의외로 냉장, 냉동 창고가 드물다는 것이었다. 궁여지책으로 우리는 상온창고를 임대해 냉장·냉동 시설을 시공했다. 비록 급하게 진행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고객이 잠들기 전에 한 주문을 일어나기 전까지 배송해주는 샛별배송 서비스를 완성할 수 있다.
마켓컬리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인정받은 걸까? 주문마감 시간을 11시로 미룬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주문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기쁜 일이었지만 이로 인해 주문처리(Order Fulfillment)에 지연이 발생했다. 당시 이는 꽤 심각한 문제였다. 물류센터가 ‘너무 좁은 것’이 원인이었다. 우리는 300평 남짓으로 주문처리 공간, 상품적재 공간, 냉동적재 공간, 부자재적재 공간, 지역별 분류 공간을 모두 해결하고, 1,500SKU(Stock Keeping Units)의 관리 및 2,000건에 육박하는 주문 처리를 해내야만 했다. 당시 물류팀 전원은 마치 결벽증 환자처럼 센터 정리만 했었다.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없는 공간을 짜내야 했다. 돌이켜보면, 이때의 악조건이 지금의 센터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정리의 힘은 생각보다 위대했다.
그로부터 약 1년 더 하남센터를 운영하고, 더욱 늘어난 주문량 때문에 더는 이를 운영할 수 없었을 때 우리는 송파구에 위치한 복합물류센터로 센터를 이전했다. 약 2,000평이 넘는 대형 센터였다. 우리는 하루 2,000건 이상의 주문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단 하루의 영업휴일 없이 1,500SKU의 상품 이동을 포함한 센터 이전을 해냈다. 이로써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했다.
도전은 기존가치를 부정하는 것부터
지금도 김슬아 CEO, 박길남 CSO와 소주잔을 기울일 때 우리는 자랑삼아 이야기한다.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팀은 별로 없다. 우리는 남들이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가장 어려운 부분(신선물류)부터 접근하였으니, 이제 컬리의 물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기존의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출발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은 필자의 물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어찌 보면 미친 짓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스스로 ‘이건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다.
그때마다 답은 현장에 있었다.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며 정답을 찾고 또 찾았다.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라 생각한다. ‘경력’이 많다는 것은 일정 업무를 잘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반대로 경력은 고정관념으로 작용해 새로운 것에 대한 반감을 높일 수도 있다. 우리는 물류를 몰랐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었고, 그 도전을 성공시켜왔다.
이러한 도전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많은 고객이 우리의 상품을 구매해주었고, 주변에서 응원도 많이 받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 새벽배송을 하는 커머스 업체 2, 3위 매출을 합쳐도 컬리 매출의 60% 정도(대외비 기준)에 그치는 것도 작은 증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위기는 올 것이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우린 극복할 것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마켓컬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돈키호테처럼 커다란 풍차를 향해 돌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