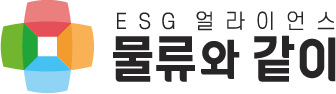글. 설창민 SCM 칼럼니스트
"127년부터 발간된 미국의 해운물류 간행물 ‘저널오브커머스(Journal of Commerce)’는 지난 9월 네덜란드계 3PL업체 세바(CEVA Logistics)의 인수를 위해 많은 글로벌 대형 물류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국과 중국도 자금 여유를 가진 물류기업들을 중심으로 대형화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다”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이 오프라인을 끌어당기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오프라인의 대표주자인 ‘운송물류’를 아우르는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했다. 아웃소싱과 파트너쉽이 대유행을 한 지는 이미 한참이 흘렀다.
그런데도 물류기업들은 파트너쉽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수합병(M&A)에 계속 나서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만으로 국제운송과 내륙운송 모두를 포함한 ‘운송물류’를 통합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을까. M&A의 성행은 파트너쉽과 아웃소싱만으로는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 파트너간의 조합으로 물류 서비스를 구성할 경우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이 나는지 물류업계 관계자라면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물류, IT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필자도 네트워크 관리와 IT 개발을 자사가 아니라 자사와 거래관계만을 가진 파트너가 수행하고 있을 때의 업무 불편을 종종 겪었다.
만약 우리나라에 진출한 한 외국계 기업이 3PL업체를 변경한다고 하자. 이 경우 외국계 기업의 IT 지원은 싱가폴이나 중국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가 대응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자사 본부 인력이 아닌 본부의 파트너사 인력이 할 수도 있다. 3PL업체도 IT 또는 네트워크 지원을 자사가 아닌 자사의 파트너사가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외국계 3PL업체라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 또는 지역 본부와 계약한 파트너사가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가장 복잡한 협업 조합은 아래와 같다.
이쯤 되면 모두가 한국에 있거나, 함께 있으면 반나절 만에 될 일이 하루나 이틀 걸리는 것은 다반사다. 미처 점검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해결하는 절차에 질려 버려서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효율은 물 건너간다. 그런 건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글로벌 다자간 회의를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바로 그 때마다 척척, 그것도 직접 전화 걸고 메일 보내서 다 해 보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란다. 필자가 점심을 대접해서라도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IT가 이 정도인데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운송자원을 동원해야 하거나, 계획 차질로 운송자원을 다른 곳에 배분해야 할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자사가 직접 국제운송의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예상도착시간)를 관리하는 것보다 파트너사가 관리하는 정보를 받아서 관리하는 경우 ETA의 정확도와 품질이 더 떨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리라.
왜 파트너가 아닌 통합인가
이러한 불편을 경험을 통해 아는 화주기업들은 공용 플랫폼이나 파트너쉽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제한된 물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수요나 공급이 넘칠 때 면피라도 된다. 그러니 모르긴 몰라도 ‘나만을 위한 물류 네트워크와 나만을 위한 서비스’를 원하는 화주가 글로벌로 존재하고, 보통 이들은 ‘긴급할 때 자신만을 위한 물류 자원 확보, 안 급할 때 남들한테 나의 물류 자원 전배’라는 자세를 취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물류기업들은 더욱 더 ‘통합(인수합병)’하려는 것이 아닐까 한다.
게다가 이미 물류시장에는 이종산업에서부터 넘어온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을 봐서라도 통합은 가속화된다. 아마존과 같이 물류기업보다 더 물류를 잘 하는 화주기업이 등장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물류기업들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국제운송과 내륙운송을 아우르는 ‘운송 네트워킹’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효율적으로 창고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한 최첨단 로봇과 인공지능을 동원한 이종산업의 경쟁자들이 더 잘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운송 자원에 관한한 이종산업의 경쟁자보다 더 많은 고객을 보유한 3PL업체들이 네트워킹의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통합에 나설 수밖에 없다. 사실 이종산업의 경쟁자들이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를 내세우고 운송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사실상 물류기업들이 통합에 나서는 이유와 같다.
파트너든 통합이든, 있을 때 잘해야
이러한 통합의 물결 속에서 정작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말단의 오퍼레이터들은 바람 앞의 잡초처럼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다. 인수기업의 인사 정책에 적응해 가면서 과거 인수기업을 단순 파트너 취급하던(막말로 급하다는 요구를 자원 부족을 이유로 거절한다 해도 아무 뒤탈이 없었던) 과거를 떨쳐 버리고 인수기업의 관리 표준, 인수기업의 네트워킹 니즈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하지만 어쩌랴, 그것은 파트너를 ‘일단 내 필요부터 채운 뒤 고려할 대상’으로 바라보던 인간의 본성의 결과물일 뿐이다.
지난호에서 필자는 혼나고 맞아 가면서 배운 기술을 로봇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내주는 현실을 지적하고,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는 사람을 혹독한 환경으로 내몰지 말자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통합이라는 형태가 나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 같으면 파트너일 때부터 파트너가 아쉬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이 맞고 그것이 더 인간적이다.
수십 년 전 많은 SF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에서 ‘지구 대통령’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했다. 영화 <제 5원소>에도 지구 연방 대통령이 등장한다. 시대는 지구 기업의 등장을 예고해 왔고, 실제 그런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물류라고 해서 그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처음부터 파트너쉽을 오래 지속하기 어려웠으니까.
군 복무 전 우연히 하게 된 창고 알바를 계기로 물류에 입문, 아직 초심을 안 버리고 물류하고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글을 쓸 때가 가장 행복해서 개인 블로그(http://blog.naver.com/dcscully)를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실무 경험으로 물류업계 종사자들의 삶과 애환을 독특한 시각과 필체로 써내려가는 것이 삶의 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