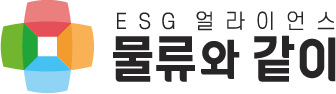지난 9월 말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때 본지는 긴급진단을 통해 물류기업이 더 는 모기업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통운 이전에 압수수색을 받았던 몇몇 물류기업 이야기를 기사에 버무렸다.
기사의 취지는 비자금 창구가 된 물류기업을 탓하는 게 아니었다. 기사는 대기업 물류자회사 성장하면 할수록 검찰의 단골손님이 되고, 물류 자회사 성장 이면에는 대기업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사실이다.
그런데 기사에 거론된 범한판토스에서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본지는 이 기업이 모기업 회장의 6촌 일가가 대주주로 있고, 올 초 검찰이 기업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포착해 압수수색한 것과 이 기업의 지분 관계를 짤막하게 다뤘다. 기사가 지면에 반영 됨과 동시에 항의가 쏟아졌다. 업무 중, 취재 중 시도 때도 없이 말이다. 한 번 걸려온 전화는 최소 30분이 지나지 않고서는 끊길 줄을 몰랐다.
신문사도 엄연한 회사다. 기자의 일이 외부에서 취재 하고, 기사를 쓰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회사 내에서는 직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도 있는 것이다.
일례로 기자는 팀장과 업무와 관련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날은 외부로 취재를 나가지도 않았다. 기자 개인적으로나 회사 차원에서도 훨씬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마디 채 나누지도 못하고 그만둬야 했다. 팀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항의 기업 관계자였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목소리가 테이블 건너에 앉아있던 기자 귀에까지 들렸다.
금방 끊을 거란 생각 안 했지만, 그렇다고 회의 중이라는데 할 말을 다 쏟아낼지도 몰랐다. 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 내부에서 할 일이 있었기에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내부에서 할 일마저 못한 셈이었다.
해당 기업은 이후에도 불편하다는 뜻을 고수했다. 기사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자료 요청을 해도, 본지에서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거부했다. 결국 본지가 가진 자료로 대체하겠다니, 그건 불안했는지 신문 인쇄 직전에 사진을 보내왔다.
신문사 측의 잘못으로 받아야 하는 항의라면 달게 받는다. 하지만 사실 보도임에도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독자의 의견을 존중할 뿐이다.
기사에 거론돼 불편하다는 뜻을 충분히 존중했고, 항의가 올 때마다 대화로 풀어보려 노력했다. 그리고 기사가 개재된 10월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