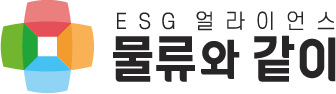발표. 김용영 매일경제 기자 / 정리. 김정현 기자
한 TV 프로그램에서 황재근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의 역할이 단순히 옷을 디자인하는 것을 넘어 어떤 소재로, 어떤 공정을 거쳐 옷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한 적 있다. 디자이너의 역할이 의류 생산 과정 전체를 포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과정 안에는 ‘물류’가 포함돼 있다. 디자이너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한 이유는 물류가 그만큼 여러 산업에 침투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대부분 모든 산업에 물류가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이제는 ‘물류’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IT와 스타트업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본 기자가 생각하기에, 물류와 기술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CPND(Contents, Platform, Network, Device)는 현재 IT 산업의 핵심을 꿰뚫는 용어다. CPND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 보통 시장은 D(디바이스)로 시작해 C(콘텐츠)로 끝난다. 아이폰을 예로 들면, 시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아이폰 기기(디바이스)의 가치가 높다. 그러나 아이폰이 범용화되면 애플이 기기 판매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감소한다. 시장의 주도권은 통신사 등의 네트워크 업계로 넘어가며, 그 다음이 네이버나 아마존처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우리는 플랫폼 포화 상태에 살고 있다. 이제 새로운 것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부상하는 것이 바로 ‘콘텐츠’다.
IT산업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CNPD 구조로 물류산업을 분석해 보자. 디바이스는 트럭, 기차, 비행기와 같은 운송수단이다. 이들을 연결하는 철도, 항공 등이 네트워크다. 그리고 이러한 운송행위의 접점에 있는 철도역, 물류창고, 항만, 공항 등은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물류시장의 콘텐츠는 무엇일까?
요컨대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이 콘텐츠를 정의한다. 기차에는 해운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를 실을 수 없다. 기차에는 기차에 맞는 유통 포맷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물류 산업의 대표적인 콘텐츠로는 무엇을 들 수 있을까? 아마존의 ‘대쉬버튼’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대쉬버튼은 플랫폼으로서의 아마존이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일종의 콘텐츠다. 실제 대쉬버튼은 아마존의 새로운 사업 분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미래 물류 시장에서는 콘텐츠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자가 시장을 이끌어나가지 않을까 싶다. 콘텐츠의 변화는 곧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