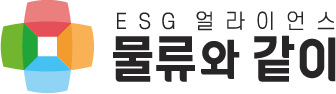개선보다 쉬운 건설, 쉬운 길이 능사인가
하드웨어 중심 스마트시티 정책, 소프트웨어 눈 돌려야
글. 설창민 SCM 칼럼니스트
스마트시티가 국가 주요 아젠다로 떠올랐다. 그리고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방법은 기존 도시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쪽에 무게추가 쏠리는 모양이다. 여러 이해 관계자와 합의와 조정을 통해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쉽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내 스마트시티 구축은 빅데이터와 같은 소프트웨어보다는, 인프라 중심의 ‘하드웨어’에 편중돼 있다. 그 반대급부는 없을까. 스마트시티, 조금은 ‘어렵게’ 가야된다는 고민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더욱 많은 인구가 도시에 몰린다. 그런 도시에게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량, 그에 따라 증가하는 유지보수비용, 환경오염은 큰 숙제로 다가온다. 이런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스마트시티’ 구축과 확산을 꿈꾸는 우리 시대의 사명이 될 것이다.
시대적 사명을 받아들인 선각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빈 땅에 새로 도시를 짓는 것이 기존 도시를 개조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최근 사례로 투자회사 벨몬트파트너스(Belmont Parnters)는 지난 11월 13일 미국 애리조나주의 사막지대 1억 평방미터(약 3,000만 평)의 땅에 인구 18만 명이 거주할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빌 게이츠가 이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소식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역사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시대 전 세계 주요 도시에는 과거 권력자가 꿈꿨던 이상을 ‘건축’을 통해 현실로 만들었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모스크바 대학교 본관’은 구소련 스탈린 시대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이었고, 로마제국의 ‘콜로세움’은 혈투 속에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가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히틀러의 꿈을 실현시켜준 건축가로 평가받는 알베르트 슈페어는 제 3제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웅장한 ‘베를린 올림픽경기장’과 ‘템펠호프 공항’을 지었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선화공주한테 장가간 백제 무왕은 국가 권력기반 강화를 명목으로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하고 ‘미륵사’를 세우지 않았던가. 모두 기존 도시가 아닌 ‘새로운 도시’에서 답을 찾았다. 쉬우니까 거기서 답을 찾은 것이리라.
그렇게 만들어질 새로운 도시에는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살게 됐다. 지금은 아련한 옛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10년 전 판교 신도시 분양 사례를 생각해보자. 당시 판교에 살게 된 사람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선택된 자들이 누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아마 이러한 신도시 구축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 보던 전형적인 미래도시가 완성될 것이다.
상상해 보자. 극도로 발달한 미래도시, 온갖 편의를 다 누리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증오로 가득한 누군가의 눈빛, 그리고 일어나는 범죄,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구도시를 찾아오는 수사관들, 거기서 구닥다리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여기서 구도시와 구닥다리 삶이란 아직 스마트시티화가 되지 못한 지금 우리 도시의 모습과 같다. 이런 배경의 영화와 소설은 하도 많아서 열거하기도 어렵다.
건설보다 어려운 개선
물론 새롭게 스마트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도시를 스마트하게 개선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교통이 혼잡한 곳에 대한 라스트마일 배송을 자전거나 스마트 모빌리티로 대체한다고 해보자. 새로 지어지는 도시에는 넓은 자전거 도로와 차도를 분리하고 곳곳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일정 간격으로 보관함을 설치할 수도 있다. 새로운 도시에서는 누가 봐도 멋지게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도시에서는 일단 있는 자전거도로마저도 점거해 버리는 불법주차 차량들부터 몰아내야 한다. 특정 구간은 불가피하게 자전거가 차도를 달려야 하므로 가뜩이나 좁은 도로의 구획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충전소와 보관함을 두려면 여러 명의 땅주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 기존 도시에서는 비록 멋은 없지만 사람들과 합의와 협조를 통해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인프라를 구성하고 그것을 빅데이터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진다. 또한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구현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기업이나 학교 등 다양한 이들이 개인정보 침해가 없는 선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대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모두 말 많고, 탈 많고, 일에 비해 성과는 안 나오며, 그렇기에 환영받지 못하는 골칫거리가 된다.
하지만 어렵사리 스마트시티를 만듦으로 얻는 혜택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도시를 개선하는 데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 필자가 앞에서 말한 ‘전형적인 미래도시’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로 그 명성을 떨친 덴마크의 코펜하겐도 따지고 보면 말 많고, 탈 많고, 일에 비해 성과 안 나는 일들을 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재생에너지를 더 활용할 지, 어떻게 하면 자전거 이용자가 자동차 이용자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더 잘 공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다.
물론 우리도 이미 소프트웨어 관점의 스마트시티 사례를 갖고 있다. 택시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만들어낸 서울의 ‘올빼미버스’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스마트시티 수준은 ‘하드웨어’에 편중되어 있다. 하드웨어, 즉 공공 와이파이나 초고속 LTE 통신 등에서는 나무랄 데 없지만 친환경, 클린에너지 활용 등 소프트웨어는 아직 부족하다.
사실 친환경과 클린에너지와 같은 소프트웨어 역량은 비단 스마트시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미 갔어야 할 길이다. 즉,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갔어야 할 길을 어렵게 가는 것에서 탄생한다. 그리고, 그 길에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의 또 다른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
군 복무 전 우연히 하게 된 창고 알바를 계기로 물류에 입문, 아직 초심을 안 버리고 물류하고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글을 쓸 때가 가장 행복해서 개인 블로그(http://blog.naver.com/dcscully)를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실무 경험으로 물류업계 종사자들의 삶과 애환을 독특한 시각과 필체로 써내려가는 것이 삶의 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