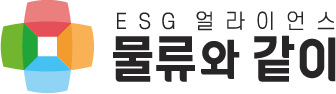온라인쇼핑계 ‘애플(apple)’ 선언…최대 쇼핑네트워크 구축
파트너에 이익 돌려주는 ‘어바웃’…전자상거래 변화 주도할 것

|
|
who?
-. 1969년생 -.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MBA,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 오리콤, LG애드 근무 -. NHN 검색사업부장, eBiz본부장 -. 現 옥션 어바웃 총괄 |
그리고 NHN으로 옮겨 8년여간 검색광고, 전자상거래, 디스플레이광고 등 3개 부서를 담당하며 검색사업부장, eBiz 본부장을 지냈다.
그의 프로필을 보는 순간 여 상무가 스카우트된 이유와 ‘어바웃’이 쇼핑몰에 입점 및 판매수수료를 일절 받지 않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감이 왔다. 그는 광고의 달인이었다.
“어바웃의 파트너는 입점몰과 소비자다. 최저가보다 저렴한 ‘어바웃가(價)’를 찾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두 파트너는 윈윈(win-win)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반에 상품광고검색을 도입해 어바웃 자체수익을 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이라 생각한다. 인터넷 쇼핑을 위해 어바웃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건 입점몰에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그들에게 수수료를 받을 일이 아니다.”
여 상무는 이를 ‘PBP(Partner Benefit Program)’라고 설명했다. 즉 파트너에게 이익을 돌려주자는 개념이다. 어바웃에 쇼핑몰 3400곳이 입점한 것도 PBP가 사업 핵심이기 때문이다.
경쟁사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입점했다. 여 상무는 아직 입점 의사를 밝히지 않은 11번가도 곧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취재에 나선 기자는 2000년대 중반까지 지름신이 들려 인터넷 쇼핑 끈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인터넷 쇼핑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 두 세 시간을 찾아도 원하는 상품을 찾지 못해 돈을 더 주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일이 빈번했다.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과 작별한 상태다.
|
“어바웃의 파트너는 입점몰과 소비자.
|
이런 소비자의 쇼핑 편의를 위해 나온 것이 어바웃의 ‘퀵바이’와 ‘이미지검색’ 기능이다.
여 상무는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폴더와 터치, 어느 통신사로 이동하느냐를 고민하는 사람과 아이폰4를 사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의 쇼핑은 다를 수밖에 없다. 후자처럼 사려는 제품이 정확하면 인터넷 쇼핑이 어렵지도, 오래 걸릴 일도 없다. ‘퀵바이’와 ‘이미지검색’은 전자로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 만든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쇼핑을 편하게 하는 게 어바웃의 핵심이다. 이는 여 상무가 생각하는 쇼핑몰과 쇼핑검색사이트의 발전방향이기도 하다. 페이스북이 페이지뷰로 구글을 넘어선 이유도 이용하기 편해서다. 여 상무는 전자상거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기를 써서 밥을 짓든 빨래를 하든 그건 이용자의 마음이다. 다만 이용자가 강남에 살든 강북에 살든 같은 회사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나. 쇼핑몰도 마찬가지다. 어떤 물건을 얼마에 어떻게 팔지는 쇼핑몰 마음이다. 여기에 한 번만 로그인하면 모든 쇼핑몰 물건을 보고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으면 소비자는 편해진다. 어바웃이 이런 인프라로 인식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정작 매일 이런 걸 생각하고 이게 일인 여 상무는 인터넷 쇼핑을 즐길까? 여 상무는 인터넷으로 생수를 자주 산다고 했다. 인터뷰 당일 폭우가 쏟아지던 창 밖을 보며 이런 날 생수처럼 무거운 걸 마트에 직접 사러 가는 건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또 인터넷 즐겨찾기에 청바지, 티셔츠 등 패션 품목별 폴더를 만들어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유행하는 거나 마음에 드는 것을 보면 담아 놓는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산다.
인터넷에 나만의 옷장을 두는 거다. 생각해보면 일과 쇼핑을 동시에 하는 셈이다. 이는 옥션 여직원들에게 배운 쇼핑법이라고.
여 상무는 경쟁사가 어바웃과 같은 쇼핑전문 포털을 만든다면 이는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라고 했다. 오히려 시장을 키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바웃의 노하우를 충분히 공유할 의사도 있다.
여 상무는 1년 안에 입점몰과 소비자 그리고 어바웃이 윈윈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다. 기자는 아직 어바웃을 이용해보지 않았기에 여 상무의 의견에 동의할 순 없다. 하지만 1년 안에 기자에게 지름신이 내린다면 다시 한 번 여 상무를 찾아 어바웃 성공 신화를 듣겠다.

김누리, 김철민 기자 olleh@segye.com